
지석영, 종두침을 들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
- 328호
- 기사입력 2015.07.28
- 편집 김진호 기자
- 조회수 9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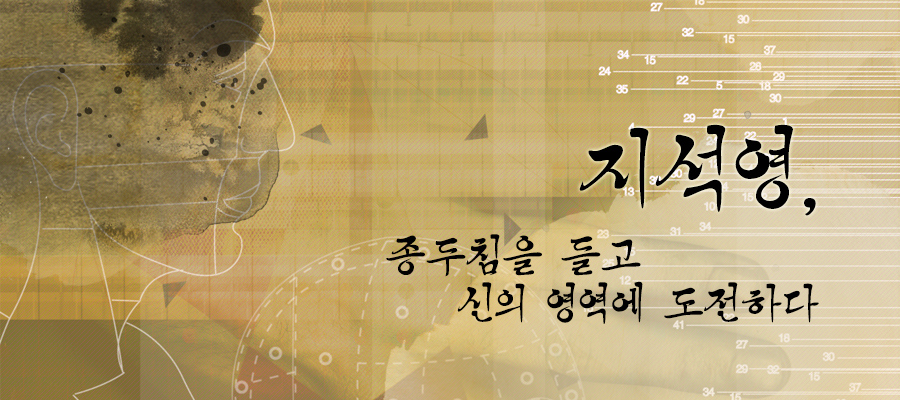
글 : 김상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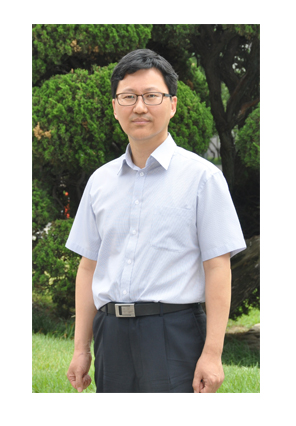
얼마 전까지 인류에게 혹독한 불행을 주던 전염병 중에 두창(痘瘡, 천연두)이란 것이 있었다. 두창에 감염된 어린이의 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1796년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할 당시 영국에서 두창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의 90% 이상이 10세 이하의 어린이였다. 두창에 걸린 아이들이 용케 살아남는다 해도 고통은 계속되었다. 두흔(痘痕, 곰보)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성장한 후에 남성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으나 여성, 특히 결혼 적령기에 달한 여성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두창은 외관상 가장 중요한 얼굴에 평생의 굴레를 씌워 놓는 악명 높은 존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창을 ‘마마’라고 불렀다. 우리 조상들은 가족 중에 두창이 발병하면 환자에게 귀신이 들어온 것이라 여겨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였다. 굿을 할 때 그 귀신이 환자에게 온 손님이니까 고이 모셔 내간다고 하여 손님이란 이름이 생겼을 것이며, 궁중에서 국왕이나 비빈(妃嬪)을 마마라고 부르듯이 귀신에게 극존칭을 써서 마마라 한 것 같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두창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었고, 역설적으로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기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문헌상 우리나라에서 이 신의 영역을 최초로 넘나든 사람은 ‘유아의 신’, ‘조선의 제너’라 불린 송촌(松村) 지석영(池錫永)이다. 그는 서울의 한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의술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 조카가 두창으로 목숨을 잃은 뼈아픈 경험 때문에 종두에 관심이 많았다. 스승 박영선(朴永善)이 일본에서 가져온 <<종두귀감(種痘龜鑑)>>이란 의학서를 독학했고, 개항장인 부산에 내려가 일본 해군 군의관으로부터 종두술을 익혔다.
마침내 지석영은 1879년 12월 충북 충주 덕산에서 두 살 난 처남에게 종두침을 놓아 성공했다. 한국 의료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다. 이듬해에는 직접 일본에 건너가 두묘(痘苗) 제조법을 배우고 돌아왔다. 그 후 전주와 공주에 설치된 우두국에서 종두법 보급에 힘썼고, 우리나라 최초의 종두서인 <<우두신설(牛痘新說)>>을 지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종두법을 정부사업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점차 아이들에게 종두를 해주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석영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지석영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무당들이었다. 당시에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두창이 발병하면 집안 전체가 귀신에게 화를 당하게 될까봐 용한 무당을 모셔 오곤 했다. 무당들은 굿을 해주고 돈을 벌었다. 특히 마마 환자가 목숨을 건지면 자기들이 소원을 빌어 살아난 것이라고 우기며 ‘보너스’를 요구했다. 설령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그것은 가족의 정성 부족이나 필연적 운명, 즉 팔자타령으로 얼마든지 돌려 설명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지석영은 무당들에게 전혀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무당들은 지석영에게 서양 귀신이 씌었다거나 두신(痘神)에게 벌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당들의 말이 옳다고 맞장구치는 백성들도 많았다.
급기야 1882년 임오군란 당시 군중은 지석영의 종두장에 불을 질러버렸다. 이때 간신히 몸을 피한 지석영은 미신타파야말로 근대의학 보급의 전제조건임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간 후 고종에게 개화 상소를 올려 미신타파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아 세도를 누리던 진령군(眞靈君)이라는 무당을 강도 높게 공격했다. 하지만 그에게 되돌아온 답변은 4년 동안의 귀양살이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종두가 보급되는 과정에는 지석영과 무당들, 즉 의학의 영역과 신의 영역간의 ‘전면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 No.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28 | 370호 꽃피는 봄과 함께 오는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 | 2017-04-28 | 6243 |
| 27 | 368호 인공지능 왓슨, 의사를 대신할 수 있다? | 2017-04-03 | 6234 |
| 26 | 366호 고혈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2017-02-22 | 6198 |
| 25 | 364호 늘 새해마다 하는 결심 | 2017-01-25 | 6691 |
| 24 | 362호 대통령이 맞았다는 길라임 주사? | 2016-12-28 | 7712 |
| 23 | 360호 문틈으로 스며드는 저승사자, 연탄가스 | 2016-11-27 | 6261 |
| 22 | 358호 1950~1970년대 대한민국은 기생충 왕국 | 2016-10-28 | 5316 |
| 21 | 356호 1950~1970년대의 국민병(國民病), 결핵 | 2016-09-28 | 6982 |
| 20 | 354호 한국전쟁과 한국 의학의 업그레이드 | 2016-08-26 | 6797 |
| 19 | 352호 의사 · 의학생의 해방 맞이 | 2016-07-27 | 6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