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구속영장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가
- 219호
- 기사입력 2011.01.31
- 취재 이수경 기자
- 조회수 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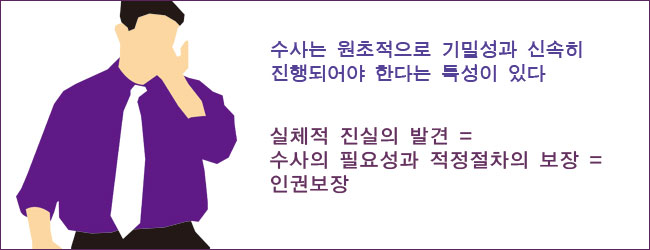 |
글 : 노명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주주의 국가의 재판제도는 3심의 심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하급심 판사의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연륜 있는 상급심 판사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함으로써 이를 시정하게 하려는 생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상급심 판사에 의해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자제하고 나름대로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는 견제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제기능은, 상소나 항고라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결정에 대해 항고를 배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영장담당판사의 기각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청구건수 중 무려 23%를 상회하고 있고,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편이라고 한다. 살인사건에 대해 검사가 4-5번 재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사람의 신병을 두고 양기관간 힘겨루기라도 하는 형극이다. 무죄가 추정되는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다. 영장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인 만큼 개별사건의 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수사는 원초적으로 기밀성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수사의 필요성과 적정절차의 보장=인권보장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양대 이념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영장의 발부요건으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일응의 기준을 삼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한 판사의 재량은 합리적 재량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자칫 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판사가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고의이든 실수이든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오류 자체를 연륜이 쌓인 상급심 판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영장발부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항고를 통해 불복을 하고,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검사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혹자는 현행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의 재청구에 의해 이러한 오류는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또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우리 법은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결 2006.12.18. 자 2006모646)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심급판사에 의한 간접적인 사후 구제장치만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영장처분에 대한 견제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항고제도를 인정하면, 상급심의 선례를 통해 구속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이나 수사기관인 검찰은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들쑥 날쑥하는 영장에 대한 결정은 전관예우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이 현행법상 판사의 영장처분에 대해 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입법적으로 잘못된 규정이다. 입법제정 당시 우리가 참고한 일본 형사소송법 제429조는‘재판관’의 다음 처분에는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제2호에서 구금에 대한 처분을 나열하고 있다. 우리 입법자들은 이를 본 받아 규정하면서, 여기서‘재판관’을 ‘재판장과 수명법관’으로 풀어서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입법제정 당시에는 영장담당판사제도가 없었다. 소수의 판사들이 당직을 돌아가면서 영장을 담당하면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사건이 늘고 판사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영장만을 전담하는 판사제도를 두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아닌 영장담당 판사의 구속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일본법처럼‘법관’이라고 규정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법률 선진국이라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영장판사의 구속처분에 대해 항고절차를 두고 있다. 검찰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상급심 판사에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연유로 잘못된 입법인 만큼 입법적인 개선 차원에서 보완을 하면 된다. 영장담당 판사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처분인 만큼 그 자체 불복의 대상으로 삼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과 검찰간의 무익한 법적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방법이외 대안이 없다. |
편집 | 이수경(good710@skku.edu) |
| No.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98 | 221호 보험사기 처벌규정을 신설하자 | 2011-02-28 | 3162 |
| 97 | 219호 판사의 구속영장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가 | 2011-01-31 | 3300 |
| 96 | 217호 우리 대학에 가칭 ‘과학수사대학원’을 만들자 | 2010-12-30 | 3940 |
| 95 | 215호 검사 앞에서의 거짓말은 유죄(?) | 2010-11-30 | 3718 |
| 94 | 213호 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2010-10-27 | 3524 |
| 93 | 211호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가 신뢰를 받는 이유 | 2010-09-30 | 3800 |
| 92 | 209호 사이버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정비 | 2010-08-30 | 3491 |
| 91 | 209호 범람하고 있는 포르노의 단속이 절실하다. | 2010-08-03 | 4656 |
| 90 | 205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의견에 대한 단상 | 2010-06-27 | 3675 |
| 89 | 203호 형사법 공부는 legal mind를 배양하는 공부 | 2010-05-31 | 4043 |
- 처음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최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다. 검찰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증거인멸 시도를 한 바 있고, 뇌물을 건네 준 사람의 자백진술이 결정적인 증거일 수 밖에 없는 뇌물사건의 특성을 무시한 자의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의 영장기각은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최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다. 검찰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증거인멸 시도를 한 바 있고, 뇌물을 건네 준 사람의 자백진술이 결정적인 증거일 수 밖에 없는 뇌물사건의 특성을 무시한 자의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의 영장기각은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