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왜 법관과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가
- 234호
- 기사입력 2011.08.17
- 취재 최예림 기자
- 조회수 3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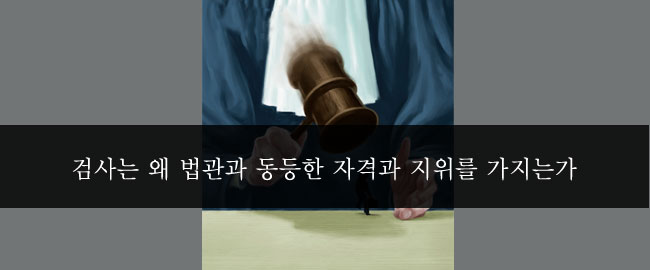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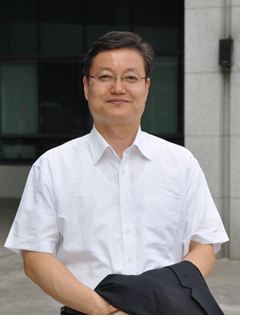 검사는 행정 각부 중의 하나인 법무부 소속의 행정 공무원이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법관과 같은 신분상의 보장을 받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검찰청법 제37조)는 규정이 그것이다.
검사는 행정 각부 중의 하나인 법무부 소속의 행정 공무원이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법관과 같은 신분상의 보장을 받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검찰청법 제37조)는 규정이 그것이다.
검사의 임용자격(동법 제29조)뿐만이 아니라 검사로 한번 임관되면 판사와 같이 신분이 보장된다는 특성을 한마디로 準法官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왜 검사에게 이러한 준법관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을까.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는 독립된 관청이다. 검사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면서 형벌을 집행하고 공익의 대표로서 다른 법률에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상급 검사의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임제 행정관청(獨任制 行政官廳)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권한이 외부로 행사되면 확정적인 효력이 있으며 내부적으로 상사의 결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검사의 대외적인 직무집행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막강한 검찰권의 행사는, 오로지 수권자인 국민의 뜻을 살펴 양심과 법률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검찰 내부는 물론 밖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에게 위와 같은 준법관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검사는 부편불당(不偏不黨)하게,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 즉, 객관의무(客觀義務)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유죄청구만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재판을 청구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물론 유리한 증거도 함께 법정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준법관적인 지위와 객관의무는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형사소송절차가 대륙법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독일식 준법관론이나 객관의무론은, 최근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주의가 강조되고,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당사자주의 소송절차가 강조되면 수사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엄두도 낼 수 없게 된다. 결국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책임 있는 검찰로서는 초동단계의 실행자인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해 지휘를 강화해야 할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 적정절차를 옹호하는 비판자로서 검사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나아가 이러한 객관의무론이나 준법관론은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 즉, 검찰권한의 내재적 통제원리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고집하다보면 수사절차에서 적정절차를 스스로 침해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그러나 준법관적 지위나 객관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절차에 위배하여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소송제기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검찰권 남용의 억지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에 기한 소송법적인 구제를 통해 담보될 수 있는 것이지 검사의 자율적인 의무규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를 인권침해의 가능자로서 파악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충, 강화하는 권리적 측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준법관론이나 객관의무론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객관의무를 강조하다보면 논자의 의도에 반해서 오히려 검찰권의 강화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 자칫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고,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경찰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는 도구개념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이를 둘러싸고 파생되는 많은 폐단을 이러한 검사의 준법관적 지위나 객관의무론 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검찰 스스로의 증거수집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부적 규제원리의 하나로서 일정부분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자율적인 수사개시권이 부여되었다. 이를 두고 벌써 검경간의 해석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는 수사의 전 단계에 불과하므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의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사라는 명칭으로 수사의 기본원칙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되며, 차제에 ‘내사’ 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해 오던 검찰과 경찰의 종전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
또한 경찰은 마구잡이식으로 수사개시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폐해는 온통 국민에게 귀착되기 때문이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경찰의 수사 권력에 대해 적정절차의 비판자로서, 인권의 옹호자로서 검사의 이러한 준법관적 지위나 객관의무는 새롭게 재평가될 시점에 놓여 있다.
편집 | 최예림 기자 (cheyeerim@skku.edu)
| No.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08 | 244호 300만원 돈봉투의 진실게임 | 2012-01-16 | 4452 |
| 107 | 241호 합성사진의 공개 | 2011-12-21 | 4512 |
| 106 | 239호 대배심제도란 무엇인가 | 2011-11-28 | 4829 |
| 105 | 238호 우리 정부의 부정부패척결 의지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 2011-10-12 | 3975 |
| 104 | 236호 뇌물죄 피고인의 변명 | 2011-09-14 | 3968 |
| 103 | 234호 검사는 왜 법관과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가 | 2011-08-17 | 3898 |
| 102 | 232호 최근 검경간 합의내용과 향후 수사권 조정의 문제 | 2011-07-14 | 3337 |
| 101 | 227호 해적사건의 재판에서 엄한 국민적 합의를 보여줄 때이다 | 2011-05-27 | 3765 |
| 100 | 227호 법무사 제도와 변호사 통합논의에 관한 단견 | 2011-05-03 | 4120 |
| 99 | 223호 법무부의 검사임용안에 대한 소고 | 2011-03-28 | 3954 |
- 처음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