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증거의 實(실)과 허(虛), 그리고 변호사의 무지
- 286호
- 기사입력 2013.10.17
- 편집 최보람 기자
- 조회수 7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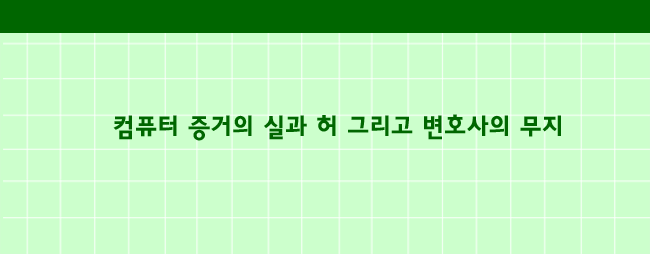
글 : 노명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수사기관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컴퓨터가 필수불가결한 생활 도구가 된 만큼 컴퓨터 증거가 범죄수사에 유용한 증거가 되고 있음은 당연한 이치다. 대검찰청 포렌식연구소가 일선 검찰청에 수사지원을 나간 건수가 2009년 1,546건, 2010년 2,856건, 2011년 4,127건, 2012년 6,3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검찰 압수수색 건수 전체의 약 70%이상, 대기업 등 회사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만 보아도 이를 실감할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컴퓨터가 필수불가결한 생활 도구가 된 만큼 컴퓨터 증거가 범죄수사에 유용한 증거가 되고 있음은 당연한 이치다. 대검찰청 포렌식연구소가 일선 검찰청에 수사지원을 나간 건수가 2009년 1,546건, 2010년 2,856건, 2011년 4,127건, 2012년 6,3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검찰 압수수색 건수 전체의 약 70%이상, 대기업 등 회사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만 보아도 이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컴퓨터 증거가 대다수 傳聞證據(전문증거)인데 피의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거나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다.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내가 작성한 것이 맞고, 작성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조서나 자술서에 대해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이러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로서 자격인 證據能力(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일반 평범한 시민이라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에 대해 감히 모른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유명 정치인이나 공안사범, 대기업 재벌사건 등 국민의 관심을 가질만한 대형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런 문서는 일체 모르는 것이라고 부인하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조서나 진술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기본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내가 작성한 것이 맞고, 작성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傳聞法則(전문법칙)이라고 한다. 만약 원진술자가 피고인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모른다고 주장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애써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건이라도 전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증거로서 사용여부가 결정되고 마는 것이다. 피고인만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출력된 문서라도 입장은 같다.
형사소송법에 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두게 되었을까?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수사기관이 독립투사들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서를 ‘꾸며’ 죄를 뒤 짚어 씌우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법제정 당시 우리 선조들은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해서만큼은 원 진술자가 이와 같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그렇다면 피의자가 컴퓨터에 직접 작성하여 저장한 일기장, 메모지 등 문서의 경우는 어떤가? 이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를 모른다고 부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이러한 조항은 미국의 Hearsay rule(전문법칙)을 모델로 삼아 규정한 것이다. 사람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 진술자로 하여금 반대신문을 통해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는 증거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진정성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쉬 값(hash value)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라고 한다. 포렌식 절차에 의해 생성한 해쉬 값의 오류비율은 ‘사람이 7번의 벼락을 맞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보다도 더 낮다고 한다. 그렇다면 DNA감정결과 보다도 더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의해 수집된 컴퓨터 증거에 대해 원본증거와 다르다거나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몰래 저장시켜 놓은 것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한 법정공방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컴퓨터 증거의 수집, 분석에 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전문증거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법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증거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거나 민사제재를 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의 이러한 안티 포렌식(anti- forensic) 행위에 대해서 까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삭제하기 전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하고 있다.
IT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우리 환경에 걸 맞는 컴퓨터 증거의 수집이나 분석방법, 증거능력에 관해 구체적인 법률을 가지지 못한 것은 입법의 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실무가인 변호사가 컴퓨터 포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법의 불비를 빌미삼아 터무니없는 법정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면 이는 법정모욕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부족이 너무나 아쉽다.
| No.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28 | 286호 컴퓨터 증거의 實(실)과 허(虛), 그리고 변호사의 무지 | 2013-10-17 | 7069 |
| 127 | 27호 '오르낭의 매장'(Burial at Ornans) - 사실주의와 법실증주의 | 2013-10-11 | 6725 |
| 126 | 284호 일제시대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의 의미와 전망 | 2013-09-18 | 5804 |
| 125 | 282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 2013-08-16 | 6215 |
| 124 | 280호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 이란 무엇일까? | 2013-07-15 | 12792 |
| 123 | 278호 국정원장의 불구속 기소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 2013-06-18 | 7408 |
| 122 | 276호 수사현장에서 프로파일링은 필수적이다. | 2013-05-23 | 7374 |
| 121 | 272호 성폭력 행위자의 변명 | 2013-05-09 | 12504 |
| 120 | 270호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안 된다 | 2013-02-13 | 4918 |
| 119 | 268호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다 | 2013-01-18 | 5507 |
- 처음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