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럴 수 있어”
- 353호
- 기사입력 2016.08.16
- 취재 이지원 기자
- 편집 이수경 기자
- 조회수 8138
글 : 이상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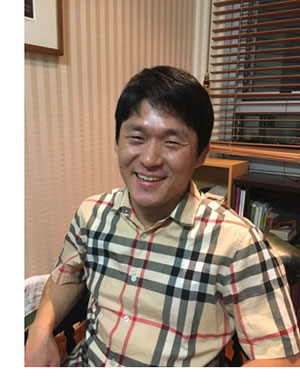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우리생활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그에 맞추어 변화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에 노출된다. 가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는 듯하다. 빅 데이터(big data),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등, 다양하고 무수한 정보들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문제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느낌이 든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우리생활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그에 맞추어 변화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에 노출된다. 가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는 듯하다. 빅 데이터(big data),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등, 다양하고 무수한 정보들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문제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느낌이 든다.
정보는 이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핵심적 가치로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산업현장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생산성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대량생산은 소규모 생산체제에서 대규모 생산체제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사람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부여 받게 되었고, 소비자로서는 수동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이내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1936년 제작된 찰리 채플린 주연의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를 보면, 사람을 생산 과정의 하나의 부품, 단순한 일을 실수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존재로 본다. 결국 그 강요 속에 주인공은 톱니바퀴 속에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는 정신병원에도 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가졌던 인간에 대한 관점을 고찰한,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블랙 코미디라는 느낌이다.
사람의 본질적 가치에 의미를 두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사용자경험(UX; user experience)"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제품,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서 전사적으로, 전과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 중심의 전략적 개념이다. 이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후이다. 더 이상 소비자로서 사람의 수동적 자세를 기대할 수 없다. 생산자, 개발자는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이를 사회현상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정보의 홍수 속 초연결 시대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이제 세상은 매우 복잡해졌다. 그 속의 구성원, 구성 요소는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살짝 질문을 바꿔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이겠는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empathy)"을 강조하고 싶다. 공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감정을 이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때, "실버폰"이라고 불리던 피처폰이 시장에 출시된 적이 있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나름의 전략이었으리라. 화면도 크고 버튼도 크고 복잡한 기능은 배제하고 핵심적 기능을 강조한 폰이었다. 하지만 실버폰은 실패했다. 노인 사용자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IT 기기에 익숙한 "스마트 시니어"층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실버폰을 쓰면서 "나는 노인이다"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감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의 부산물과 맞닿아 있어 보인다. 경험은 기억으로 연결되고, 그 기억의 본질은 아날로그적 감성이다. 정보화 시대에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아날로그적 감성에 목말랐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 저변에서 지금 주 경제 소비 계층인 3,40대의 콘텐츠적 공감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감은 사회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은 혼자 하는 삶을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혼자일 수 없는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온라인 세상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페이스북에서의 공감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감인가? 공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정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그러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숨길 수 있고 꾸밀 수 있지 않은가? 이제는 오프라인에서의 무엇인가가 온라인에서 활성화 되는 것을 넘어서, 온라인 세상에서의 무엇인가가 오프라인으로 표출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앞으로의 사회현상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제 학생 이야기다. 공감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다. 넓게 보면 사람 간의 관계일 것이고 좁게 보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일 것이다. 교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두 번째 해, 지도하던 학부 학생이 있었다. 한 번은 그 학생이 생활 상의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들 중 하나를 한 것이다. 초짜 교수 나름의 열정으로 한참을 혼을 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조금은 차분해진 스스로를 느끼며 그 학생에게 한 마디를 덧붙였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러자 그 학생이 우는 것이다. 혼 날 때 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말에 울기 시작했다. 이제 상황은 역전이다. 어찌할 바를 모른 체, 물었다. 왜 우냐고. 그러자 그 학생이 여전히 울면서 말했다. "그렇게 말 해 준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름의 교수로서의 개똥(?) 철학이 생겼던 것이. "공감하는 교수가 되자. 학생 눈치 보는 교수가 되자." (덧붙이자면, 당시 그 "남학생"은 실수를 하지 않았었다. 오해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금 박사과정에 있다. 함께...)
이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제 학생 이야기다. 공감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다. 넓게 보면 사람 간의 관계일 것이고 좁게 보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일 것이다. 교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두 번째 해, 지도하던 학부 학생이 있었다. 한 번은 그 학생이 생활 상의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들 중 하나를 한 것이다. 초짜 교수 나름의 열정으로 한참을 혼을 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조금은 차분해진 스스로를 느끼며 그 학생에게 한 마디를 덧붙였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러자 그 학생이 우는 것이다. 혼 날 때 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말에 울기 시작했다. 이제 상황은 역전이다. 어찌할 바를 모른 체, 물었다. 왜 우냐고. 그러자 그 학생이 여전히 울면서 말했다. "그렇게 말 해 준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름의 교수로서의 개똥(?) 철학이 생겼던 것이. "공감하는 교수가 되자. 학생 눈치 보는 교수가 되자." (덧붙이자면, 당시 그 "남학생"은 실수를 하지 않았었다. 오해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금 박사과정에 있다. 함께...)
공감이란 게 별 게 있겠는가. 넘치는 정보 속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당연한 덕목이리라. 사람에 대한 디지털적 이해가 아니라 아날로그적 몰입일 것이다. 자, 이제 스스로에 대한 공감부터 하는 게 어떨까. 자신을 너무 객관화 하지 말고 때로는 "잘 하고 있어!"라며 스스로를 토닥거리며 칭찬해 줘도 되지 않을까.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을 넘어 홀대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공감해야 하는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출발점이다. 스스로에게 한 번 말해 보시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었다고.
| No.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69 | 483호 아름다운 경쟁을 위하여 | 2022-01-17 | 2565 |
| 68 | 481호 [고전의 지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 2021-12-14 | 2686 |
| 67 | 480호 [고전의 지혜] 제대로 겸손하기 | 2021-11-30 | 2823 |
| 66 | 479호 역경逆境 극복에 대한 고전의 지혜 | 2021-11-11 | 2451 |
| 65 | 477호 고전의 지혜 : 일을 대하는 자세 | 2021-10-13 | 2722 |
| 64 | 475호 고전의 지혜 : 쉬운 듯, 쉽지 않은 효 | 2021-09-13 | 3028 |
| 63 | 467호 정년 후에 깨달은 또 다른 배움의 길 | 2021-05-13 | 3219 |
| 62 | 465호 코로나는 우리를 쇼핑하게 만든다? 코로나와 쇼핑 테라피 | 2021-04-13 | 3107 |
| 61 | 463호 패러다임 전환과 2021학번, ㄷㄷㄷㅈ | 2021-03-11 | 4384 |
| 60 | 461호 "그분과 같이 연구 할 수 있다면..." | 2021-02-15 | 48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