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피고인의 변명
- 236호
- 기사입력 2011.09.14
- 취재 최예림 기자
- 조회수 4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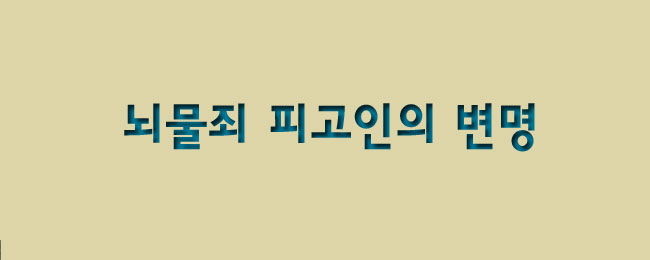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 ‘집사람이 받은 것을 이 사건이 터지고 알았다’ ‘향응(饗應)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의례적인 것으로 알았다’ ‘성접대는 받았지만 떠나는 사람 정으로 알고 받았다’ ‘생활이 어려워 친구가 보태준 것으로 생각했다’ ‘차용한 것이고 이자는 못주지만 원금은 돌려주려고 하였다’ ‘선의로 주고 받았다’는 등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다 언급하기에는 지면이 짧을 것 같다. 차용한 것이어서 검찰에 출두하기 전 변제하고 왔다는 연민어린 주장도 있었다. ‘야당의 차별이다’ ‘여당의 역차별이다’ 심지어 선거자금 부정공출과 관련해서는 ‘패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하소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 ‘집사람이 받은 것을 이 사건이 터지고 알았다’ ‘향응(饗應)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의례적인 것으로 알았다’ ‘성접대는 받았지만 떠나는 사람 정으로 알고 받았다’ ‘생활이 어려워 친구가 보태준 것으로 생각했다’ ‘차용한 것이고 이자는 못주지만 원금은 돌려주려고 하였다’ ‘선의로 주고 받았다’는 등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다 언급하기에는 지면이 짧을 것 같다. 차용한 것이어서 검찰에 출두하기 전 변제하고 왔다는 연민어린 주장도 있었다. ‘야당의 차별이다’ ‘여당의 역차별이다’ 심지어 선거자금 부정공출과 관련해서는 ‘패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하소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게 되면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부당한 이익’ 즉 뇌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1.3.24. 선고 2010도17797)」고 하여 말로는 명확한 것 같지만 막상 피고인의 변명을 뒤 짚고 뇌물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1990년대 초경 필자가 서울지검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로서 뇌물사건을 수사할 당시 회자된 말로서 ‘일도 이빽 삼부(一逃 二빽 三否)’라는 말이 있었다. 뇌물죄가 발각되어 수사가 착수되면 일단 ‘도망’가고, 그 다음 ‘빽’을 동원하여 사건의 귀추를 파악하면서 무마해 보고, 그것도 어렵게 되어 검거되면 무조건 ‘부인’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바뀐 것 같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어디를 가도 방범망 카메라가 부착되어 주행하는 차량의 소유자나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차량을 수배라도 하면 운전자의 소재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도망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해외로 도주한다해도 외국과의 수사공조(搜査共助)나 범죄인인도조약(犯罪人引導條約)이 잘 되어 있어 금방 검거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서 우리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은 곳으로 도피하면 도피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公訴時效)도 정지되도록 하였다(동법 제253조제3항).
그래서인지 뇌물이 발각되어 수사라도 받게 되면 도망가기 보다는 빽을 동원하여 무마해 보려고 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동원하여 무조건 부인(否認)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신조어도 이런 배경 하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을 부풀리고 있다.
종래는 뇌물을 수표로 주고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 검사의 입증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마운 사례(?)에 속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간이 큰 사람이거나 두 사람 만의 은밀한 거래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주고받았을 것 같다. 혹자는 너무 영리한 나머지 ‘떳떳한’ 돈거래였다는 역 발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누가 뇌물을 금방 들키는 수표로 받겠습니까’ ‘누가 계좌추적이 쉬운 통장으로 받겠습니까’ 하는 어느 지방청의 국장이나 단체장의 변명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요즘 들어 법인카드나 신용카드를 직접 건네주어 떳떳하게(?) 사용하게 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뇌물 뒷거래는 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옛말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고 했다. 두 사람만의 은밀한 거래라고 생각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의미다. 수표를 가져다 환전해 주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은 눈치가 빠르다. 돈을 세탁해 주면서 넌지시 건넨 한 마디가 법정의 증거가 되어 돌아온다. ‘국장님 어디서 난 수표인가요’ 라고 묻는 말에 ‘말 못해’ 하면서도 ‘응 아파트 준공해 주고 받은 거야. 김 주사! 이서하지 마’ 한다. 환전하러온 사람보다는 함께 따라와 뒷전에 서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서해 두는 것이 은행 직원의 습관(?)이고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사례도 있다.
현금이라고 안전할리는 없다. 돈다발이 무겁다보니 혼자 운반하기도 어렵고, 들고 가는 운전기사도 알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온 회사직원도 알고 있다. 뇌물죄로 기소하는 검사로서는 피고인 측에서 어떤 주장이 제기될 것인지 항상 예측 가능해야 하고, 어떠한 변명도 뒤 짚고 뇌물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참고인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천외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무죄주장에 대해 참고인마저 이에 동조하는 날이면 검사는 외로운 돛단배 한척에 몸을 기댄 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기분에 빠지게 된다. 참고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배 밑창을 뚫고 자폭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쩌랴! 특수부 검사라면 이런 날에 대비해서 비장의 무기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고 있다.
10-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재판장이 나서서 직권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맞장구치는 참고인을 꾸지람(?)하여 진술을 돌이켜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법원은 자백하는 공여자나 참고인의 진술마저 믿어 주지 않으려는 기색이다.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용성에 대한 평가는 과학수사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검찰에서의 자백진술과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 어느 것을 더 신용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自由心證)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심증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부인하는 진술만을 신용하려한다면 이는 법관의 편견일 수 밖에 없다.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못 믿는다면 기소 전에 법관 앞에 데려가 진술을 보전(保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21조의2). 그러나 어디까지나 참고인이나 공범의 진술에 한정되고, 당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증거보전의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입법례에 따라서는 자신에 대한 형벌의 감면을 조건으로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이를 판사가 확인해 주는 방법도 있다. 이것이 현재 법무부가 입법추진 중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司法協助者 刑罰減免制度)이다. 언제까지나 ‘일벌’ 만을 잡는 약한 거미줄로서의 검찰이 아니라 ‘왕벌’도 잡기 위한 튼튼한 법망(法網)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법원의 협조라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뇌물이 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은 검찰만의 몫이 아니다. 법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억울한 사람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되지만 유죄인 자를 무죄로 방면하는 것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 | 최예림 기자 (cheyeerim@skku.edu)
| No.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08 | 244호 300만원 돈봉투의 진실게임 | 2012-01-16 | 4488 |
| 107 | 241호 합성사진의 공개 | 2011-12-21 | 4551 |
| 106 | 239호 대배심제도란 무엇인가 | 2011-11-28 | 4868 |
| 105 | 238호 우리 정부의 부정부패척결 의지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 2011-10-12 | 4017 |
| 104 | 236호 뇌물죄 피고인의 변명 | 2011-09-14 | 4019 |
| 103 | 234호 검사는 왜 법관과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가 | 2011-08-17 | 3940 |
| 102 | 232호 최근 검경간 합의내용과 향후 수사권 조정의 문제 | 2011-07-14 | 3373 |
| 101 | 227호 해적사건의 재판에서 엄한 국민적 합의를 보여줄 때이다 | 2011-05-27 | 3810 |
| 100 | 227호 법무사 제도와 변호사 통합논의에 관한 단견 | 2011-05-03 | 4159 |
| 99 | 223호 법무부의 검사임용안에 대한 소고 | 2011-03-28 | 3993 |
- 처음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