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센 검사, 더 센 기자
- 248호
- 기사입력 2012.03.19
- 취재 이해오름 기자
- 조회수 5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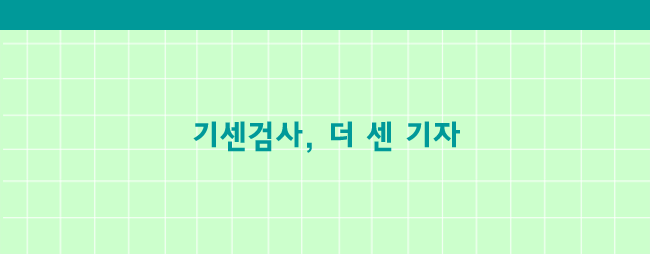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여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다행히 검사의 사표는 반려되었지만 판사와 검사 두 사람 만의 대화내용이 항간에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여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다행히 검사의 사표는 반려되었지만 판사와 검사 두 사람 만의 대화내용이 항간에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
흔히 검사는 기가 세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들 못지않게 기가 센 직업군이 우리나라 기자들이다.
일부 지역 특히 시골일수록 기자가 왕이다(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X라 무섭다. 기자와 골프를 하기라도 하면 골프장 부킹은 기자들의 몫이다. 검사가 부탁하면 골프장에서는 마지못해 늦은 시간대 부킹을 하나 해 준다. 적당히 치다가 해떨어지면 들어오란다. 그러나 기자가 부탁하면 다르다. 황금시간대를 받아 온다. 그것도 두 팀이나...
기자는 성미도 급하다.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라도 하면 하루 만에 자백을 받고 그 다음날이면 영장 쳤냐고 물어 온다. 이미 데스크에 ‘검찰, 00차관 구속영장청구 방침’이라고 기사를 보냈단다. 영장 청구가 힘들게 되었다고 하면 빨리 영장을 만들어 내라고 성화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세간의 흥미를 끄는 사건의 경우에는 기자들과 사전에 약정을 맺는다.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같이 큰 검찰청에는 기자실이 있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그때그때 수사결과를 알려주는 대신 수사가 완료되어 공개될 때까지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이다.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사협정인 셈이다. 그러면 간사는 기자실 칠판에 ‘000 검사실 000 사건 엠바고’라고 적어 둔다.
어느 한 신문에서 이런 약정을 깨고 신문에 보도하는 날이면 난리가 난다. 이럴 때일수록 약속을 어긴 신문은 특종(特種)이라고 보도한다. 해당 기자는 기자실에 길게는 몇 달간 출입이 금지되겠지만 수사검사는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한다.
해당 기자의 변명은 한결같다.
“X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나 몰래 데스크에서 써 재껴가지고...”고 핑계를 댄다.
검사가 중요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기자는 귀신처럼 눈치를 챈다. 수사검사가 기자들에게 모르쇠로 일관하면 기자의 역량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옆방의 검사에게 살짝 묻기도 하고, 평소 친분 있는 검사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도신문하기도 한다. 검사실의 휴지를 뒤지는 것은 필수다. 그것도 안 되면 검사에게, 수사관에게 술 한잔 하자면서 몰래 카메라를 동원하고, 여직원에게도 노래방 가자고 보채기도 한다.
최후에는 억측성 보도를 쓰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검사는 상사에게 변명하느라 애를 먹고 그 다음 조사일정을 잡기도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수사상황을 조금이라도 알려 주게 되면 그 다음 부터는 기자가 쓰는 펜대에 놀아나야 한다. 기자가 신문지상을 통해 수사지휘하려 달라 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수사의 기밀도 문제지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중대한 위기에 처한다.
아무리 사건관련 뉴스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물론 국회의원 등 사회중요인사의 사생활은 때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보통은 기소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 한해서는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도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무죄가 된다.
검사에 따라서는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살짝 팁을 주기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억측기사를 섞어 대문짝만 하게 보도가 된다. 그리고 기자는 검사의 전화를 안 받는다. 이를 ‘잠수 탄다’고 한다. 검사는 열나게 전화해 보지만 당연히 안 받는다. 약 오르지만 할 수 없다. 깨끗이 대가를 치룰 수밖에... 부장검사로부터 검사장, 대검 공보관에 이르기까지 해명하라고 난리다. 물론 검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한동안 시달리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다른 언론 기자들의 해코지도 만만치 않다.
며칠이 지나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소식이 끊겼던 기자가 살짝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0 검사! 저 왔어요∧∧...”
애교 섞인 말투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표시다.
검사가 퉁명스럽게 묻는다.
“그 동안 어디 갔었어?”
“다 알~면서... ” 아양을 떤다.
“말도 마소. 전 죽었소! 그 동안” 검사는 투덜댄다.
“잘된 것도 있잖아. 신문이 떠들어 대니까 사건이 확 풀렸잖아! 자기 이름도 뜨고”
마치 검사이름을 언론지상에 띄어 주었으니 고맙게 생각하라는 투다.
사건에 따라서는 기자에게 살짝 흘려주고 그 분위기를 보기도 한다. 대개 재미를 본다. 공식적인 브리핑보다 살짝 흘려주는 기사는 지면을 많이 할애해 크게 써 주고, 약발이 먹히면 사건도 술술 풀린다.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계산된 홍보이고, 못된 수사관행이어서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해당 검사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형법 제126조에서는 검사가 직무상 지득한 범죄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언론기자 들의 해코지도 각오해야 한다. 보도되지 않은 검찰의 치부나 뒷이야기를 들 쳐내 검사의 뒤통수를 친다. 그 정도는 양반이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검사의 사생활을 운운하기도 한다. 다른 검사가 똥바가지를 쓴다. 기자들이 작심하고 옛날 수첩을 뒤져서 써 갈기면 영문 모르고 당한다. 그렇게 당한 검사 여럿 있다. 신문기자는 한번 들은 것은 수첩에 조목조목 기재되어 언젠가 필요한 때 반드시... 꺼내 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 취중에 실언이라도 하는 날이면 여지없다.
그래서 기자와는 가깝게도, 멀리도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교육한다.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적당히 하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것도 없지만, 어쨌거나 신임검사에게는 기자를 조심하라고 교육한다.
검찰청은 기자들이 각 검사실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불쑥 불쑥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최근 검찰청은 각 층마다 스크린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노련한 기자일수록 손쉽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기자들의 생리이고, 알아야 식성이 풀리는 직업병이다.
오늘도 검사는 기자와 한판 승부를 겨루고 있다.
한쪽은 숨기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찾아내고...
그래서 기자는 검찰청 담벼락을 넘고 있다. 「This means war」 다!
편집 | 이해오름 기자 (lhor70@skku.edu)
| No.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78 | 179호 '그저 바라보다가' - 위장결혼하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을까? | 2009-05-28 | 4247 |
| 77 | 177호 '내조의 여왕' - 보험사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관계 | 2009-04-27 | 4739 |
| 76 | 175호 일본드라마 '히어로' - 기소독점주의의 무서움 | 2009-03-26 | 4344 |
| 75 | 173호 '꽃보다남자' - 따돌림이라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 2009-02-27 | 5576 |
| 74 | 171호 '아내의 유혹' - 처벌하기 너무 힘든 강간 | 2009-01-28 | 5612 |
| 73 | 172호 '종합병원2', '외과의사 봉달희', '뉴하트' - 그들의 이야기 | 2009-01-06 | 5498 |
| 72 | 169호 부부클리닉-‘무촌(無寸)관계인 부부’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 2008-12-01 | 4591 |
| 71 | 168호 CSI를 보는것이 불편해진 이유 | 2008-11-15 | 4329 |
| 70 | 166호 미국의 폴리스 라인 vs 대한민국의 폴리스 라인 | 2008-10-17 | 4277 |
| 69 | 164호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 2008-09-13 | 5123 |
- 처음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